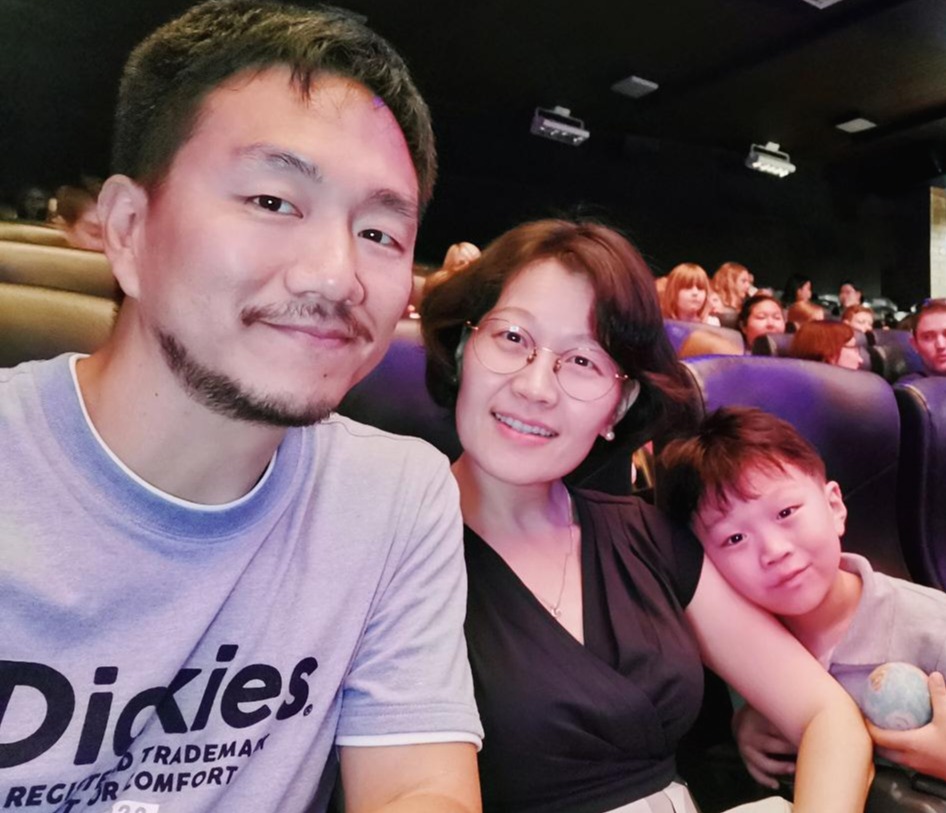J Family Story
언어로 본 다문화 사회, 호주 본문
국립국어원 오스트레일리아 통신원으로 위촉받아 언어를 통해 보는 호주 이야기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첫번 째로 소식지에 실린 글이랍니다. 출처는 국립국어원 소식지인 <쉼표, 마침표>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는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 약간 내용이 수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http://news.korean.go.kr/online/now/letter/letter.jsp?boardId=8&idx=97)
호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코알라나 캥거루 같은 동물들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코알라(Koala)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의미의 원주민어인 gula에서 나온 이름이다. 실제로 내가 만난 코알라는 유칼리투스 잎만 먹으며 마른 똥을 나무 아래 쌓아놓고 지내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캥거루(Kangaroo)는 캥거루를 가리켜 무슨 동물인지 묻는 백인의 물음에 원주민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gangurru)’라고 대답한 것이 이름으로 굳어진 경우이다. 그런가 하면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 (Canberra)도 ‘만남의 장소’라는 뜻의 원주민어에서 파생한 이름이며,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서 유명한 관광지인 울룰루 (Uluru)도 Ayers rock이라는 영어 식 지명에 밀려 사라질 뻔 했다가 1993년 제정된 이중표기법에 의해 제 이름을 찾았다. 사실 1788년 백인들의 발이 닿기 이전 호주는 원주민들(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의 땅이었기에 오랜 동안 이 땅에 속해있던 것들이 원주민의 언어로 명명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 원주민어의 현재는 어떨까?
*영어 이름 Ayers Rock이 원래 이름인 Uluru로 개명되었음을 보여주는 길 안내 표지판
원주민어의 현재
*호주 원주민 언어 지도 (출처: 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
위 사진이 보여주듯 호주는 다채로운 언어의 나라였다. 백인들의 침략 이전 250개에 달하던 원주민어는 오늘날에는 60여 개 정도만 남아있다. 그나마도 젊은 세대에서는 50% 정도만이 원주민어를 구사할 줄 알며, 원주민 보호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그 수치가 6%로 떨어진다. 구전에 의해 보존되어 온 특성을 감안하면, 원주민어가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런 원주민어의 위기는 공식 언어를 영어로 일원화하려 했던 교육 정책의 영향이다. 1901년 호주 연방 정부를 수립하면서 시작된 영어 단일화 정책은 197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그렇지만 실상 많은 원주민들에게는 영어가 제1 언어가 아니다. 실제 내가 공부하고 있는 퀸즈랜드 대학(University of Queensland)에서 원주민 출신 박사 1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노리타는 영어가 제4 언어이다. 실제로 언어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학문 방식도 너무나 달라 박사 학위를 따기까지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노리타의 이야기를 들으며 초중등 학교에서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원주민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혹은 낮게 평가 받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원주민어 통역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법정에서 원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의사의 약 처방을 잘못 이해한 한 엄마가 아기에게 연고를 먹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언어 정책으로의 전환
원주민어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호주 언어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급증하는 이민자였다. 호주는 남한의 77배에 달하는 땅덩어리에 남한 인구의 반도 채 되지 않는 223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기치 아래 한동안 이민자들을 환영한 결과, 호주 태생이 아닌 국민이 27%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이민자들과 함께 호주로 들어온 언어의 풍요로운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모국어 보존과 이들이 호주 사회에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어 구사 능력 강화가 호주 언어 정책의 양 축을 이루고 있다. 소수 언어 (community language) 교육 및 방송 장려가 그 전자라면,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영어 점수의 벽을 높이고 그 관문을 통과하면 신청자에 한해 영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후자의 예라 하겠다.
호주가 영국의 후손임을 내세우며 백호주의(White Australian Policy)를 주장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언어는 유색 인종의 이민을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영어, 또는 독일어나 그리스어 같은 유럽어로 어학 시험을 실시해 유색 인종을 걸러내곤 했다. 아시아인들에게 이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후반 골드 러시(Gold rush) 때이다. 그 역사를 아직 간직하고 있는 호주 영어(Aussie English) 표현으로 ‘Fair dinkum?’이 있다. 왠지 영어 같지 않아 보이는 이 낯선 단어는 당시 금광에서 일하던 중국인들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din(진-眞) kum(금-金), 즉 진짜 금(true gold)을 좀 찾았냐고 물었던 것이 ‘그거 사실이야? 진심이야?’라는 뜻의 영어 표현으로 굳어진 것이다.
오늘날은 오히려 중국어와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를 주요 외국어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한 아시아권 이민자 수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경제, 사회적 이익이 언어 정책을 결정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뜨는 경제로 쳐 준 것은 고맙기는 하지만, 호주가 1987년 내놓은 언어 정책 (National Policy on Language)이 영어권 국가 최초라는 점과 함께 그 포괄성을 자랑할 정도로 원주민, 이민자뿐 아니라 청각 장애인, 문맹인에 대한 고려를 담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씁쓸하기도 하다.
호주가 한국에 들려주는 이야기
호주는 한국과 달리 다문화 다언어라는 바탕 위에서 세워진 나라이다. 앞에서 살펴 본 호주의 예는 언어 정책이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선도해 왔음을 보여준다. 비록 최근의 언어 정책이 다양성이라는 가치보다는 가시적인 이익을 더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호주의 선택은 동질화에서 다양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리고 동질화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강자의 언어와 문화를 강요했던 역사를 호주는 부끄러워하고 있다. 다문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 언어 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는 호주가 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한국의 언어 정책을 기대해 본다.